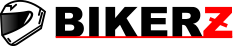너와 나, 조용한 개척의 시간들
본문
** 나는 경남권에 주차를 해놓고 한달에 2주는 그곳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즌오프가 없는 지역이라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부동항을 찾아헤메는 블라디보스톡 같은 느낌이라 보면 좋을 것 같다.
- You and I, Quiet Days of Discovery -

시 작 ⸻⸻⸻⸻⸻⸻⸻⸻⸻⸻
사진작가로 산다는 건 언제나 ‘먼저 가보는 삶’이다.
내가 원하는 장면은 지도에도, 블로그에도 없다.
그래서 내게는, 어디든 함께할 수 있는 기동력 좋은 동행자가 필요했다.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난 작은 빨간 슈퍼커브.
이름은 ‘이오렉’.
본래는 촬영 장소 헌팅용으로 데려온 바이크였지만
어느새 나보다 앞서 길을 읽고, 방향을 틀어주는 선발대가 되었다.
좁은 시골길, 고요한 어촌 마을, 비포장 된 산복도로까지—
이오렉은 그 어느 곳에서도 멈추는 법이 없었다.

순간 ⸻⸻⸻⸻⸻⸻⸻⸻⸻⸻
이쁜 벼루빡만 봐도 괜스레 걸음을 멈추던 날들이 있었다.
때론 한참을 바라보다 손등으로 살짝 먼지를 털어주고,
비 오는 날엔 괜히 헬멧을 벗은 채 너를 가만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개인적인 취향 때문인지, 대부분의 슈퍼커브는 주행거리 2만을 넘기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 이오렉은 묵묵하게, 아무 탈 없이 잘 달려줬다.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클럽에서도, 톡방에서도, 함께 달릴 사람 하나 없이
나는 그렇게 ‘나홀로 라이더’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오렉은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따라오는 시선들⸻⸻⸻⸻⸻⸻⸻⸻
촬영지 헌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특히 이오렉을 타고 작은 마을 골목길을 누비고 있으면,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동행’이 따라붙는다.
주로 라이더 까페에서 홀로 나오면서 시작된다.
그 중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로케이션을 둘러보던 어느 날,
뒤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거울로 힐끔 보니, 대형 바이크들이 몇 대 따라오고 있었다.
정확히는… 나를, 아니 이오렉을 따라오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멈춘 곳,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던 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혹시… 여기서 촬영하세요?”
“아, 네 뭐…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아, 저희도 그냥… 가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정적.
헬멧 안에서 웃음을 삼키며 나는 카메라 가방을 다시 매고,
그들은 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가던 길’로 조용히 헤어졌다.

골목에서 멈춘 모험⸻⸻⸻⸻⸻⸻⸻⸻⸻
또 한 번은 BMW GS1250 어드벤처 모델이
살짝 거리를 두고 뒤따라온 적이 있었다.
워낙 덩치가 있어 눈에 확 띄었고,
그날도 아마 어디서 촬영하는지 궁금했나 보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따라 들어온 골목.
이오렉은 가볍게 쏙 들어간 그 길에
GS는 진입하자마자 진땀을 흘려야 했다.
길은 급격히 좁아지고,
양옆은 돌담으로 막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
결국 내가 먼저 멈춰서자, 그도 어색하게 옆에 섰다.
“아… 혹시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서…”
“저요? 아뇨, 그냥… 촬영 중이었어요.”
“아… 그럼 저는… 나가는 길 좀 찾아볼게요…”
서로 애써 웃어보이며, 우리는 골목 끝에서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이 몇 번 있고 나니
라이더 카페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고,
톡방도 그냥 조용히 읽기만 하게 되었다.

마무리 ⸻⸻⸻⸻⸻⸻⸻⸻⸻⸻
이오렉과 나는 그렇게 묵묵히,
사람들 틈보다는 바람과 햇살 사이를 달려왔다.
어디든 먼저 들어가보고,
먼지와 마주하고,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는 시간들.
이오렉.
이젠 단순한 바이크가 아니라
내 기억을 함께 짊어진 ‘작은 개척조’다.
앞으로도 길 위에서
우린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달릴 것이다.

추가⸻⸻⸻⸻⸻⸻⸻⸻⸻⸻
‘어느 조용한 바닷가에서’
한 번은 이오렉과 함께 남쪽의 아주 조용한 바닷마을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햇살은 느긋했고, 바다는 밀려오다 말고 숨을 고르고 있었고요.
언덕 아래서 한 컷을 담으려는데, 조용히 다가온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거셨습니다.
“이거… 씨티 맞지?
옛날에 내 친구 놈이랑 저거 타고 광양까지 간 적이 있었어.
에헤이, 그땐 참 좋았는데… 아직 잘 달리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요즘도 꽤 잘 달립니다. 뭐든지 천천히 가는 맛이 있죠.” 라고 말했죠.
그 어르신은 이오렉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만히 손으로 핸들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뒷모습으로 작은 손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촬영은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으로 끝났고,
나는 그 마을의 기억을 ‘빛’ 대신 ‘온기’로 담아갔습니다.
대신 그분이 이장님이라…
이후 촬영 당일 조명등으로 세팅할때
살짝 아주 살~~ 짝 실랑이가 있었던 적이 있지만
담배두갑으로 퉁치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제는 한보루로 늘어나서 부담스럽긴하다 ^^

사람들은 얘기한다 주인을 잘 만난 바이크라고....
나는 반대라 생각한다
사랑한다 이오렉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